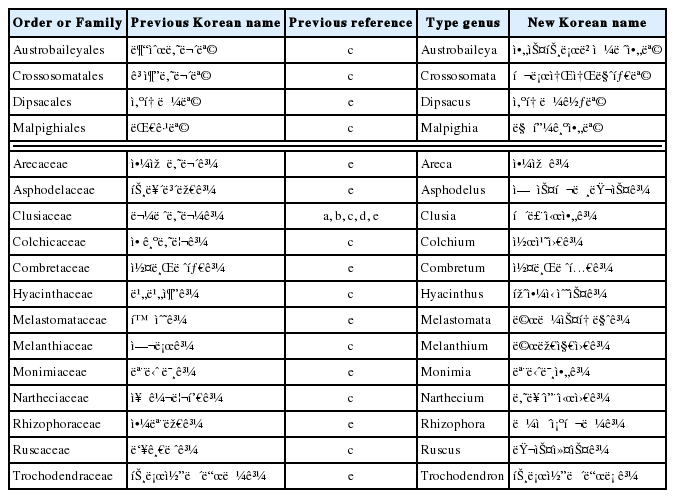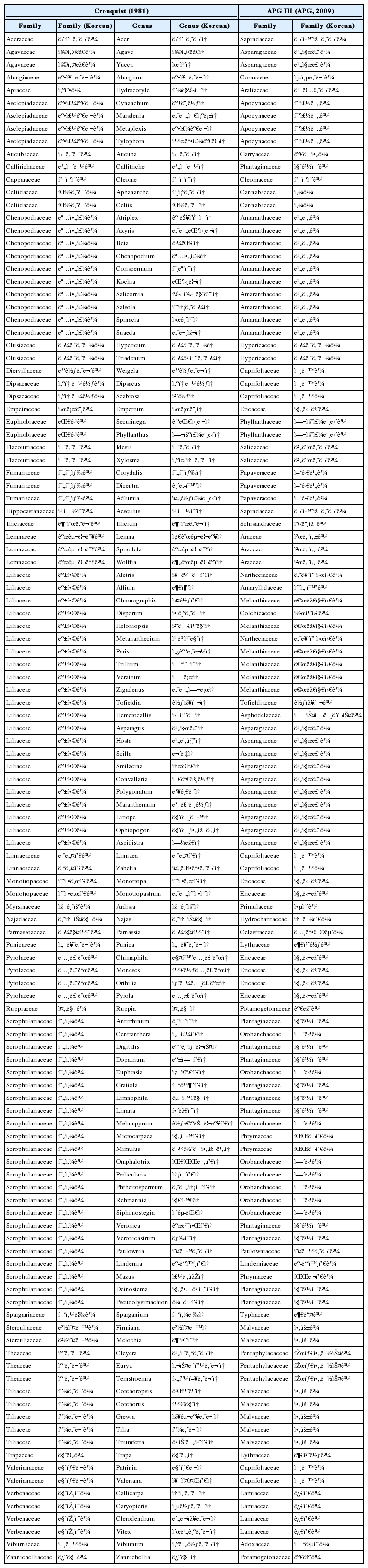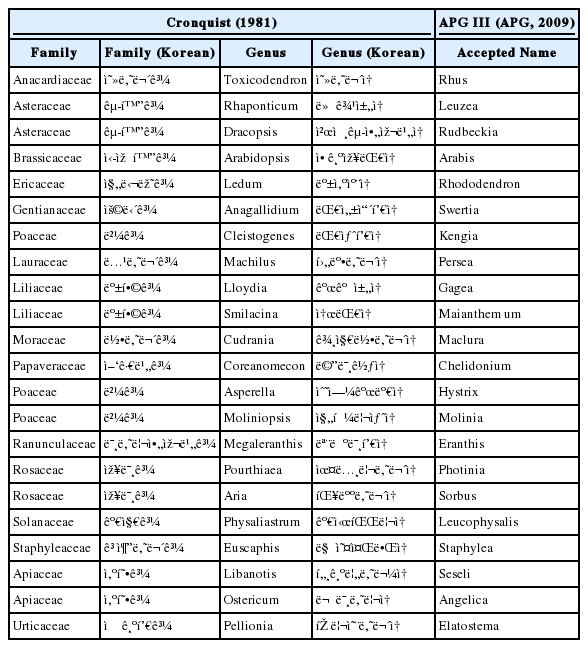APG III 분류체계의 목명 및 과명 국문화에 대한 제안
A Suggestion of Korean Names for the Orders and Families Included in the APG III Classification System
Article information
Abstract
인터넷의 발달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등으로 국내 자생 식물들과 함께 전 세계 식물들의 정보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접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PG III 분류체계에서 채택한 과명 및 목명 전체에 대한 국문의 표준화가 요구되지만,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통일적 국문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기존의 국내 자생 분류군들이 속한 과명 및 목명을 종합하여 비교하고, 2)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종들이 속하는 과명과 목명의 국문화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법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 본 연구자들이 판단한 타당한 기준에 의해 APG III 분류체계 상의 과와 목에 대한 국명의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목과 과에 대한 국명들은 향후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거쳐 공표될 국가표준안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Trans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Korean researchers frequently encounter scientific names of foreign species, and these are named on a case-by-case basis in Korean without any standard naming method. Therefore, standard Korean names for entire orders and families in the world are required for better communications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no comprehensive discussions of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names for the orders and families found in the world. In this study, we 1) compare the Korean names of orders and families in the references, 2) discuss naming methods in Korean for foreign taxa, and 3) then suggest standard Korean names for the orders and families in the APG III, which is an up-to-date angiosperm classification system. This study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Korean names for orders and families found throughout the world.
지난 이십여 년 간 식물의 계통을 추론하는 이론과 실험적 토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다수의 식물분류학자들은 공동으로 피자식물 분류체계인 Angiosperm Phylogeny Group (APG, 1998) 체계를 발표하였다. 이후 APG II (APG, 2003), APG III (APG, 2009)가 차례로 발표되어 개정되었고, 이후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 졌을 뿐, 최초 발표된 체계에서 큰 변화는 없다. 현재 분류군 인식에 대한 미소한 변화들은 새로운 분자계통학적 연구들이 추가될 때마다 Angiosperm Phylogeny Web site (Stevens, 2015; 이하 APW로 표기)를 통해 종합되어 주기적으로 분류체계에 반영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는 APW version 14가 발표된 바 있다. 최근에 발간된 거의 모든 식물분류학 교과서는 APG 분류체계를 받아들여 APG 분류체계의 순서에 의해 피자식물 분류군들을 서술하고 있고(예, Judd et al., 2008; Simpson, 2010), 현재 APW를 통해 전 세계의 식물학자들과 일반인들은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최신 분류체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들의 과명에 대한 국명들은 여러 식물 도감들 및 검색표(Chung et al., 1937; Chung et al., 1949; Pak, 1949; Chung, 1957; Lee, 1989; W. T. Lee, 1996a, b; Y. N. Lee 1996)에서 종합된 바 있다. 위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n Plant Name Index;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 이하 KPNI로 표기)에서는 자생식물과 귀화식물 등 총 205과 1,142속 4,881종의 표준명칭을 제시한 바 있다. KPNI에는 도입종과 널리 알려진 재배식물의 원종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자식물들의 배열 순서는 Engler (1964)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속식물지(Genera of Vascular Plants of Korea; Park, 2007; 이하 GVPK로 표기)에서는 217과 1,045속 3,034종의 국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Cronquist (1981)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보다 최근에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KPNI를 확장하여 재배식물들을 포함한 버전이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고 있고(Korea National Arboretum, 2014; 이하 2014년 6월 30일 버전을 KPNI-WEB으로 표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GVPK를 바탕으로한 국가 생물종 목록집의 관속식물편[National List of Species of Korea (Vascular Plants);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1; 이하 NLSK로 표기]을 편찬하여 현재까지 KPNI, GVPK, NLSK는 과명과 목명을 포함한 한반도 피자식물의 국명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등으로 국내 자생 식물들과 함께 전 세계 식물들의 정보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접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빈번히 사용되는 외국 종들에 대한 국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각각의 종에 대한 국문의 표준화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PG III (APG, 2009) 분류체계에서 채택한 과명 및 목명 전체에 대한 국문의 표준화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분류군들의 과명 및 목명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정확한 기준 없이 수시로 국문화가 이루어 졌을 뿐, 전체 과명과 목명의 통일적 국문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APG체계는 분자계통학적 연구 결과의 집약으로 수립되었고(APG, 1998; APG, 2003; APG, 2009), 목과과 수준의 상위 분류군들의 인식은 계통학적 자료가 포화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으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안정된 분류체계인 APG 분류체계 상의 모든 목 및 과명에 대한 국문 명칭의 표준화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신종/미기록종/도입종의 추가, 재배식물의 도입, 생물자원의 국제교류 등 필요시 해당 분류군에 대하여 그때 그때 새로운 국문 목 및 과명을 제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혼란을 막아주어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기존의 국내 자생 분류군들이 속한 과명 및 목명을 종합하여 비교하였고, 2)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종들이 속하는 과명과 목명의 국문화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법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 본 연구자들이 판단한 타당한 기준에 의해 APG III 분류체계 상의 과와 목에 대한 국명의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APG III 분류체계를 현재 국내 국가기관들의 종정보 관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ronquist 분류체계 (Cronquist, 1981)와 비교하여 APG III 체계 상의 국내 자생 분류군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APG III (APG, 2009)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이의 발표 후 사소한 수정이 반영된 APW의 version 14(Stevens, 2015) 분류체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내 식물 및 재배종의 리스트가 정리된 바 있는 KPNI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 GVPK (Park, 2007), Kim et al. (2008), NLSK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1), KPNI-WEB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 의 다섯 문헌에서 제시된 과명과 국문 과명들을 Microsoft Access 프로그램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들을 상호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문헌들은 국가기관에서의 배포 또는 학술 논문으로 국문 과명들은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으므로 국문 변동에 의한 혼란을 피하고자 국문화의 기준으로 제시된 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이들 문헌에 한번이라도 제시된 바 있는 국문 과명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기존에 사용된 국명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류군은 새로운 국명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Table 1). 기존의 다섯 문헌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또한 통일된 기준으로 하나의 이름을 선택하였는데, 합당한 선택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국문화된 이름을 따랐다(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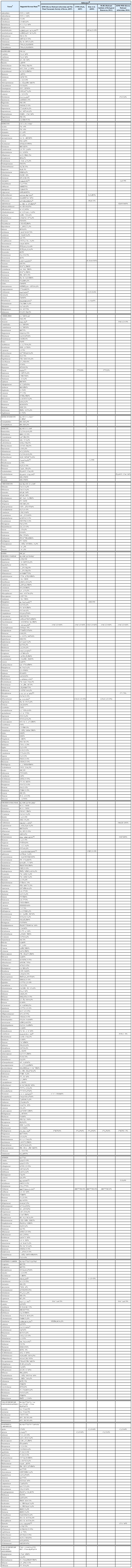
A suggestion of Korean names for the orders and families in the modified APG III classification system (APG, 2009; Stevens, 2015)
과명의 국문화는 지금까지 box 1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APG III분류체계 상에서 위의 다섯 문헌에 포함되지 않은 과들에 대한 국문화는 2-1, 2-2, 2-3의 방법 중 한가지를 택하여 명명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3의 방법인 기준속을 영어 식 발음대로 표기하고 뒤에 “과”를 붙이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따랐고, 2-1과 2-2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결과 및 고찰에서 논의 하였다. 기준속의 발음법은 영어 발음과 라틴어 발음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Mac OS X (Yosemite; ver. 10.10.2) 에서 제공하는 영어발음에 의거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외래어 표기법 규정(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4&mn_id=97)에 따른 속명의 영어 발음에 의거하여 국문화 하였다.
목명의 국문화 또한 과명의 국문화 방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국문 목명에 대해서는 KPNI, GVPK, 및 NLSK에서는 다룬 바 없어, Kim et al. (2008)과 및 KPNI-WEB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에서 제시한 국문들만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들 두 문헌에서 다룬 바 없는 목명들은 과의 국문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문화 하였다.
Box 1. 과의 국문화 방법
1. 과의 기준 속(type genus)이 국내에 분포할 때 →기준속의 국명에 의해 국문 과명을 표기
예) Phyllanthaceae (여우주머니과): 기준속인 Phyllanthus (여우주머니속)이 우리나라에 존재
Linderniaceae (밭둑외풀과): 기준속인 Lindernia (밭둑외풀속)이 우리나라에 존재
2. 과의 기준속이 국내에 분포하지 않을 때 →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채택
2-1. 기준속 외의 속이 국내에 분포하면 그 속명을 이용하여 과명 표기
예) Melanthiaceae (여로과): 우리나라에는 이 과에 속하는 Veratrum (여로속)은 분포하지만 기준속인 Melanthium은 없음
Colchicaceae (애기나리과): 우리나라에는 이 과에 속하는 Disporum (애기나리속)이 분포하지만 기준속인 Colchica는 없음
2-2. 해당 분류군이 한자권 국가에서 있을 때 과의 한자어를 국문으로 읽는 소리로 표기
예) Rhizophoraceae (홍수과): 중국식물지의 红樹科를 도입
Melastomataceae (야모란과): 중국식물지의 野牡丹科를 도입
2-3. 기준속을 발음대로 표기 (향후 분류군의 특성을 반영한 한글 이름을 새로 명명 가능)
예) Amborellaceae (암보렐라과): 기준속인 Amborella를 발음대로 표기
Lactoridaceae (락토리스과): 기준속인 Lactoris를 발음대로 표기
결과 및 고찰
위에서 제시된 기준에 의해 APW (ver. 14; Stevens, 2015)를 반영한 APG III (APG, 2009)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63목 411과에 대한 국명을 제시하였다(Table 1). 기존의 다섯 문헌에서 상이점 없이 사용된 이름들은 180과에 해당하며, 서로 다른 국명이 제시된 바 있는 8개 과에 대해서는 이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이름을 선정하였다(아래 각각의 분류군에 대한 검토 참조). 기존에 국문화 된 적 없는 22목 223과에 대해서는 새로 국명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다섯 문헌에 포함된바 있는 국문 과명들 중 APW (ver. 14; Stevens, 2015)에서 다른 과에 합쳐져 현재 분류체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48개 과들도 향후 과의 한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방법으로 국문화 하였다(Table 1, 괄호로 표시). 국명을 선정 및 재검토 한 경우에 선정 이유와 이에 대한 고찰을 아래에서 각각 설명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번호를 Table 1의 해당 분류군에 위 첨자로 표시하였다.
1) APG III (APG, 2009) 분류체계에서 기존의 분류체계상의 속이 과로 승격되어 새 국명이 필요한데, 기준속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는 Hyperaceae (물레나물과), Phyllanthaceae (여우주머니과), Linderniaceae (밭둑외풀과), Paulowniaceae (오동나무과)이며, 이들은 기준속에 의거하여 과명을 국문화 하였다(Table 1 superscript 1).
2) 기존의 문헌에서 이미 2-3의 방법에 의해 소리나는대로 국문화 되어있는 경우에 몇몇은 속의 어미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Monimiaceae를 “모니미과”로 국문화한 경우가 있지만(Korea National Arboretum, 2014), 이의 기준속은 Monimia로서 “모니미아과”가 타당하다. 같은 예로 KPNI-WEB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에 있어서 Trochodendraceae를 “트로코덴드라과”로, Combretaceae를 “콤브레타과”로 국문화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 “트로코덴드론과”와 “콤브레텀과”로 수정하였다(Table 1 superscript 2; Table 2).
3) Colchicaceae, Hyacinthaceae, Melanthiaceae, Nartheciaceae, Ruscaceae는 APG system에서 새롭게 인식된 과들인데, 각각 우리나라에 기준속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Disporum (애기나리속), Hosta (비비추속), Veratrum (여로속), Aletris (쥐꼬리풀속), Polygonatum (둥글레속)을 기준으로 국문과명을 제시한 바 있다(Kim et al.,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명명되는 국명에 안정성을 높이고자 기준 속들에 의거하여 신칭하였다(Table 1 superscript 3; Table 2; 아래 6) 참조).
4) Asphodelaceae는 KPNI-WEB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에 있어서 “트로보란과”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 기원을 파악할 수 없어 “에스포델러스과”로 신칭하였다(Table 1 superscript 4; Table 2).
5) Arecaceae는 단자엽식물이므로 2차 목부에 해당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야자나무과”가 아닌 “야자과”를 채택하였다(Table 1 superscript 5; Table 2).
6) Clusiaceae는 기준 속인 Clusia가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아 box 1의 2-1 방법에 따라 국문화되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속인 물레나물속(Hypericum)에 의거하여 “물레나물과”로 불려왔다(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 Park, 2007; Kim et al., 2008;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1;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 그러나 APG 분류체계에서는 Hyperiaceae 를 Clusiaceae 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과로 인정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Hyperiaceae의 국명을 물레나물과로 사용하고 기존에 물레나물과로 불려온 Clusiaceae를 “클루시아과”로 새로 명명하였다(Table 1 superscript 6; Table 2). 비슷한 예로 Aucubaceae에 대하여 GVPK (Park, 2007)와 NLSK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1)은 Acuba (식나무속)에 의거하여 “식나무과”로 표기하였지만, APG II (2003)에 따른 Kim et al. (2008)에서는 Aucubaceae가 Garryaceae에 포함되어 box 1의 2-1의 방법에 따라 Garryaceae를 식나무과로 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준속에 근거하지 않은 국명은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여 2-3의 방법에 의해 KPNI-WEB(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에서 표기된 바 있는 “가리아과”가 타당하다(Table 1 superscript 6; Table 3). 위의 두가지 예는 2-1에 의한 국문화 방법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이는 본 연구에서 2-3 방법에 의한 국문화 방법을 채택한 이유가 되고 있다.

Alternative Korean names (order and family) suggested in previous references and accepted Korean names in this study
7) 기존의 다섯 문헌에서 국문 과명이 서로 약간 다른 경우가 있는데, Rubiaceae는 “꼭두서니과” 또는 “꼭두선이과”로, Clethraceae는 “매화오리나무과” 또는 “매화오리과”로, Flacourtiaceae는 “이나무과” 또는 “산유자나무과로”, Droseraceae는 “끈끈이귀개과” 또는 “끈끈이주걱과”로 제시된 바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식물 국문명에 대한 종합이 이루어진 조선식물향명집(Chung et al., 1937)에서 각각 “꼭두선이과”와 “매화오리나무과”로 언급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채택하였다. Flacourtiaceae는 KPNI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와 GVPK (Park, 2007)에서 가장 먼저 국문화 되었는데, 두 문헌이 같은 연도에 발간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나무과”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였다. Droseraceae는 Chung et al. (1937)에서 “끈끈이과”로 사용되었는데, 현재 사용하는 과명과는 차이가 있어 위의 다섯 문헌에서 제시된 과명 중 임의로 “끈끈이귀개과”로 선택하였다. Gesneriaceae는 “제스네리아과” 또는 “게스네리아과”로 사용되었는데, 라틴어식 발음인 “게스네리아” 보다 영어식 발음인 “제스네리아과”를 채택하였다(Table 1, superscript 7; Table 3).
8) Plumbaginaceae의 경우 “갯길경과(Park, 2007; Kim et al., 2008;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1)”, “갯질경과(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 “갯질경이과(Korea National Arboretum, 2014)”로 매우 혼란되게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국명의 기준이 된 종인 “갯길경이[Statice japonica Siebol & Zucc.=Limonium tetragonum (Thunb.) Bullock]”가 Chung et al. (1937)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이래 비슷한 이름의 “갯질경이[Plantago major for. yezomaritima (Koidz.) Ohwi; Plantaginaceae (질경이과)]”와 혼동되어 사용된 오류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갯질경과” 또는 “갯질경이과”의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Chung et al. (1937)에서는 갯길경이가 속한 과를 “기송(磯松)과”로 가장 먼저 언급하였는데,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갯길경이는 본 과의 기준속이 아니므로 box 1의 2-3의 방법에 의해 “플럼바고과”로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가장 타당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발표되어 널리 사용되어온 다섯 문헌(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 Park, 2007; Kim et al., 2008;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1;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에서 철자는 다르지만 일관된 의미로 사용되어온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철자를 수정하여 “갯길경이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Table 1, superscript 8; Table 3).
9) Loranthaceae의 기준속은 Loranthus (꼬리겨우살이속)로, 기존에 발표된 국문 과명 중 기준속의 국명과에 일치하는 국문 과명을 선택하였다(Table 1, superscript 9; Table 3).
10) Melastomataceae와 Rhizophoraceae는 box 1의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식물들로 KPNI-WEB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에서는 재배 식물의 명명을 위해 중국식물지로부터 한자명을 도입하여 각각 “야모란과”와 “홍수과”로 표기한 바 있다.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과에 대하여 한자권 국가에서 쓰는 이름의 직역은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식물이므로 국문 과명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2-3의 방법에 의해 이들을 각각 “멜라스토마과”와 “라이조포라과”로 다시 국문화하였다(Table 1, superscript 10; Table 2).
11) Apiaceae (Umbelliferae)와 Poaceae (Graminae)는 국제조류균류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Algae, Fungi, and Plants; ICN)에 의거하여 두 개의 공식적 이름을 갖는 과들이다. Apiaceae의 경우 이 식물군이 갖는 대표적 형질인 산형화서(umbel)에 따른 Umbelliferae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산형과”라는 국명이 사용되어 왔다. GVPK (Park, 2007)과 NLSK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1)에서는 Apiaceae를 “미나리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이 과에 속하는 대표적 우리나라 식물인 미나리로부터 차용된 이름이다. 그러나 미나리는 Apiaceae의 기준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산형과”를 사용하였다. Poaceae의 경우 “벼과”(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 Kim et al., 2008;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와 “화본과” (Park, 2007;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1)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두 이름 모두 기준속을 근거로 한 이름은 아니지만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인 “화본과” 보다 단일식물명을 도입한 과명인 “벼과”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Table 1, superscript 11; Table 2).
목은 기준 과를 바탕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고, 과는 기준 속을 바탕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므로 목을 국문화 할 때 목의 기준과의 이름을 제공한 기준속의 발음에 “목”을 붙여 국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Pandanales의 기준과는 Pandanaceae이고 이 과의 기준속은 Pandanus로써 “팬디나목”이 아닌 “팬디너스목”으로 사용하였다(Table 1).
12) 우리나라 분류군들이 속한 목들의 국문이 Kim et al. (2008)과 KPNI-WEB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이 서로 다른 경우는 Asparagales, Proteales, Ericales인데, 기준속인 Asparagus (비짜루속), Protea (프로티아속), Erica (진달래속)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목명인 “비짜루목”, “프로티아목”, “진달래목”을 채택하였다(Table 1, superscript 12; Table 3).
13) Kim et al. (2008) 또는 KPNI-WEB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에서 단 한번만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수정된 목들은 Austrobaileyales, Malpighiales, Crossosomatales, Dipsacales 이다. Austrobaileyales의 경우 Kim et al. (2008)에서 국내에 분포하는 속인 Illicium (붓순나무속)에 의해 “붓순나무목”으로 사용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준속인 Austrobaileya에 의해 “아스트로베일레아목”으로 국문화하였다. 만약 Austrobaileyales를 “붓순나무목”으로 사용한다면 향후 Illiciales가 인정되어 사용할 경우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Cronquist system (Cronquist, 1981)에서는 Illiciales를 인정한 바 있다. Malpighiales와 Crossosomatales는 Kim et al. (2008)에서 각각 “대극목”과 “고추나무목”으로 사용되었지만, Austrobaileyales와 같은 이유로 기준속에 의한 이름인 “말피기아목”과 “크로소소마타목”으로 신칭하였다. Dipsacales의 경우 KPNI-WEB (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에서는 “산토끼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Dipsacus (산토끼꽃속)을 기준으로한 “산토끼꽃목”의 오기로 판단되어 수정하였다(Table 1, superscript 13; Table 2).
Kim et al. (2008)에서는 Cronquist (1981)를 반영한 GVPK (Park, 2007)와 비교하여 APGII (2003)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Liliaceae s. l. 내의 국내 속들의 재조합을 정리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체 속들을 APG III (APG, 2009)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과의 이동이 있는 속들은 120속으로 파악되었다(Table 4). 또한 Cronquist (1981)에 비교하여 APG III (APG, 2009)에서 속이 재조합되어 분류군 인식의 변화가 있는 속들은 22속으로 파악되었다(Table 5).
목명과 과명의 국문화 방법이 비록 학명과 같은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명과 마찬가지로 하위 기준 분류군을 토대로 한 국문화 방법은 다른 방법들 보다 안정성이 높아 미래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목과 과의 국명들은 2-3에 근거하여 기준속을 발음한 것에 근거한 것이지만 향후 국내에서 새롭게 많이 회자되는 종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특성을 반영한 한글 이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 이름의 새로운 작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속에 속하는 식물의 1) 원어 이름을 우리나라말로 번역을 하거나 2) 기존의 우리나라 종의 이름에 해당 분류군의 특성 또는 지역적 의미의 어구를 첨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목과 과에 대한 국명들은 향후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거쳐 공표될 국가표준안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밝힙니다.